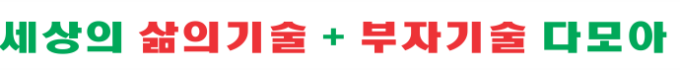내 떡과 남의 떡의 차이 - 중광
페이지 정보
작성자 harvard 댓글 0건 조회 1,257회 작성일 10-11-21 22:57
본문
2002년 3월 10일 중광 ‘스님’이 ‘입적’했다. 79년 불교계로부터 파문을 당했으니 ‘스님’이나 ‘입적’이란 말이 안 어울리지만, 그가 처음 출가한 통도사에서 다비식을 진행했다니 딱히 틀린 표현도 아니다. 그의 영전에선 일반적인 죽음의 의식(儀式)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걸쭉한 노래와 춤판이 벌어졌다. 중광의 생애 자체가 그렇게 앞뒤 구분 없고 짝이 안 맞는 신발 같았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중광의 생애를 ‘한평생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혼을 맘껏 누린 사람’이라거나 ‘승속을 넘나드는 기인이자 다재다능한 예술인‘이었다고 한목소리로 칭송한다. 아마 중광은 살아생전 자신에게 그처럼 집중적이고 호의적인 사람들의 태도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국내에서 중광은 누더기 옷에 왼쪽 가슴에는 콧수건을 달고 색동가방을 어깨에 메고 다니는 기이한 의상과 성기에 붓을 매달아 선화를 그리는 반미치광이 중, 잘해야 기인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
나는 중광의 삶을 보면서 생뚱맞게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우리 속담을 떠올린다. 중광은 선화(禪畵)의 영역에서 독보적인 세계를 구축한 예인으로 국내보다 오히려 외국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 ‘동방의 피카소’라는 칭송을 듣기도 했던 중광의 그림은 그 명성에 걸맞게 영국의 대영박물관, 뉴욕의 록펠러재단, 샌프란시스코의 동양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국내에서 그나마 중광의 예술세계에 대한 본격적인 탐색이 이루어진 것은 외국의 긍정적 평가가 우리나라에 역수입되고부터였다. 사물놀이가 외국에서의 호평을 기반으로 국내에서 새롭게 인정받은 것과 비슷하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현상에 대한 무지(無知)’와 ‘심리적 객관화에 대한 우리의 낮은 인식’이 그 원인일 것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문화재급 백자를 요강으로 쓰고 있거나 국보급 고서를 초벌 벽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눈 밝은 이의 계몽과 열정이 무지를 떨쳐내게 하는 힘이 된다. 그러나 심리적 객관화에 대한 낮은 인식은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 신문에 우리나라 정상급 CEO들과 젊고 유능한 컨설턴트 간의 개인적인 관계를 소개하는 기사가 실렸다. 어떤 경우 그들은 서로 둘만 아는 휴대전화 번호가 있을 만큼 막역한 사이라고 한다. 나는 기사를 보면서 만일 조직 내부에 있는 누군가가 CEO에게 그 컨설턴트만큼 탁월한 컨설팅을 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게 된다. 그 CEO들이 경영하는 조직의 화려한 맨파워를 감안한다면, 내부에 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부 직원과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란 게 내 결론이다. 그들은 심리적 거리를 두고 객관화하기 어려운 내부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담실에서도 나는 그 같은 사례를 많이 경험한다. 완고한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는 아들, 이기적인 시어머니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 며느리. 내가 단지 그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그들의 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알려줄 뿐인 경우에도 반응이 사뭇 다르다. 아들과 며느리가 직접 하소연할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사람들도 제3자인 내가 얘기할 때는 그 얘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남의 떡이 더 커보이는 현상’은 심리적 객관화가 작동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 내가 버린 장난감을 다른 아이가 가지고 노는걸 보면서 갑자기 그게 좋아 보였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한번쯤 있을 것이다. ‘내 떡’과 ‘남의 떡’의 경계를 규정하는 사람도 알고 보면 바로 ‘나’라는 한 증거다.
어떤 이는 중광을 일컬어 ‘인간 자체가 화두였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광은 어떤 화두였던 것일까. 한 기인과 이별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의문이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중광의 생애를 ‘한평생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혼을 맘껏 누린 사람’이라거나 ‘승속을 넘나드는 기인이자 다재다능한 예술인‘이었다고 한목소리로 칭송한다. 아마 중광은 살아생전 자신에게 그처럼 집중적이고 호의적인 사람들의 태도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국내에서 중광은 누더기 옷에 왼쪽 가슴에는 콧수건을 달고 색동가방을 어깨에 메고 다니는 기이한 의상과 성기에 붓을 매달아 선화를 그리는 반미치광이 중, 잘해야 기인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
나는 중광의 삶을 보면서 생뚱맞게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우리 속담을 떠올린다. 중광은 선화(禪畵)의 영역에서 독보적인 세계를 구축한 예인으로 국내보다 오히려 외국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 ‘동방의 피카소’라는 칭송을 듣기도 했던 중광의 그림은 그 명성에 걸맞게 영국의 대영박물관, 뉴욕의 록펠러재단, 샌프란시스코의 동양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국내에서 그나마 중광의 예술세계에 대한 본격적인 탐색이 이루어진 것은 외국의 긍정적 평가가 우리나라에 역수입되고부터였다. 사물놀이가 외국에서의 호평을 기반으로 국내에서 새롭게 인정받은 것과 비슷하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현상에 대한 무지(無知)’와 ‘심리적 객관화에 대한 우리의 낮은 인식’이 그 원인일 것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문화재급 백자를 요강으로 쓰고 있거나 국보급 고서를 초벌 벽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눈 밝은 이의 계몽과 열정이 무지를 떨쳐내게 하는 힘이 된다. 그러나 심리적 객관화에 대한 낮은 인식은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 신문에 우리나라 정상급 CEO들과 젊고 유능한 컨설턴트 간의 개인적인 관계를 소개하는 기사가 실렸다. 어떤 경우 그들은 서로 둘만 아는 휴대전화 번호가 있을 만큼 막역한 사이라고 한다. 나는 기사를 보면서 만일 조직 내부에 있는 누군가가 CEO에게 그 컨설턴트만큼 탁월한 컨설팅을 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게 된다. 그 CEO들이 경영하는 조직의 화려한 맨파워를 감안한다면, 내부에 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부 직원과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란 게 내 결론이다. 그들은 심리적 거리를 두고 객관화하기 어려운 내부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담실에서도 나는 그 같은 사례를 많이 경험한다. 완고한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는 아들, 이기적인 시어머니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 며느리. 내가 단지 그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그들의 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알려줄 뿐인 경우에도 반응이 사뭇 다르다. 아들과 며느리가 직접 하소연할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사람들도 제3자인 내가 얘기할 때는 그 얘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남의 떡이 더 커보이는 현상’은 심리적 객관화가 작동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 내가 버린 장난감을 다른 아이가 가지고 노는걸 보면서 갑자기 그게 좋아 보였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한번쯤 있을 것이다. ‘내 떡’과 ‘남의 떡’의 경계를 규정하는 사람도 알고 보면 바로 ‘나’라는 한 증거다.
어떤 이는 중광을 일컬어 ‘인간 자체가 화두였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광은 어떤 화두였던 것일까. 한 기인과 이별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의문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