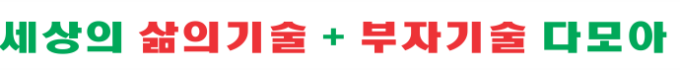수필 나도야 명품 마담 - 이 수 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Dynasty 댓글 0건 조회 3,066회 작성일 12-07-28 05:09
본문
“저 혹시 남편이 양복이 있나요?"
오래 전, 모 한인 전시장 개관 오프닝인데 오실 수 있냐는 초대의 전화 통화 중 받은 질문이었다. 초대장을 보내면 될텐데 번거롭게 전화까지 하나 했더니 꼭 정장을 하고 와야하는 자리라서 굳이 전화를 했단다. 갤러리 오프닝에서 남편이 양복 입은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란다.
“저도 초대하는 건가요?” 물었다. 나는 그런대로 옷이 있는 것 같은데 남편이 걱정이 되서 전화를 걸었단다. 우리는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응할 수 없는 자연스런 핑계가 생겨 마음이 가벼웠다.
얼마 전 한 오프닝에서 예전에 전화했던 그 멋진 여자가 손 백(clutch)을 우아하게 들고 있었다. 어디서 본듯한 눈에 익은 백이다. 집에 오기가 무섭게 집 안을 다 뒤져 그 백을 찾아냈다. 버릴까 말까 하며 처박아 두었던 것이다.
혹시나 해서 핸드백 회사 웹사이트로 들어가 보니 “아이고머니나.” 내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명품이다. 옆집 사람이 이사가며 버렸던 것을 주어 놓았었는데 이게 왠 횡재란 말인가.
브루클린의 우리 동네 그린포인트에서는 타 주에서 온 젊은 화가 지망생들이 아파트를 구하러 지도를 들고 이리저리 기웃 거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아파트를 구했는지 월말과 초에는 무빙 트럭에서 친구들과 짐을 옮기느라 부산들하다.
다른 한편에선 집 주인들이 집안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드리고 버린 빈 박스를 또는 버리고 간 물품들을 치우느라 바쁘기도 하지만. 연휴엔 부모들이 자식들이 사는 모양세를 보러 멀리서 방문하고는 스트릿 파킹을 신경쓰지 않아 티켓을 받고 당황해 하는 모습 또한 종종 보게된다.
그들과 눈이 마주치면 나는 왠지 내가 티켓을 준양 미안한 마음이 들어 “하이” 하곤 얼른 집안으로 쫓기듯 들어온다.
이렇게 시작한 화가의 길이 잘 풀리면 한동안은 짐을 쌀 필요가 없지만, 화가로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인가? 한쪽에서는 희망을 품고 이사를 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화가의 길을 접고 낙향을 하느라 많은 물건을 버리고 올 때와는 달리 소리없이 사라져간다.
우리 옆 건물은 무슨 사연이 그리도 많은지 수시로 젊은 사람들이 이사오고 나간다. 그들이 이사 나갈 때마다 나는 조그마한 횡재라도 한듯이 즐거워진다.
스트레처바(캔바스 틀), 가구, 옷 그리고 신발 등 친절하게도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박스에 넣어 길가에 내 놓거나 철제 울타리에 걸쳐놓기도 한다. 안목이 있는 화가들이 쓰던 물건이라 스타일도 좋다. 처녀 때 몸매를 그런대로 유지하는 나로서야 거의 작은 사이즈여서 잘 맞는다. 난 이런 날을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몇 번 입지 않은 새 옷들도 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명품들도 있다. 내가 기껏 아는 브랜드라고는 바나나 리퍼블릭과 제이시크루 정도인지라 혹시 해서 웹사이트로 찾다가 그 가격에 놀랄 때도 있다.
남편이 양복이 있냐며 조심스레 물었던 그 친절한 분에게 고백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해졌다.
'내 차림새는 이사가는 젊은 화가들 덕분에 생긴 옷이라구요!”
오래 전, 모 한인 전시장 개관 오프닝인데 오실 수 있냐는 초대의 전화 통화 중 받은 질문이었다. 초대장을 보내면 될텐데 번거롭게 전화까지 하나 했더니 꼭 정장을 하고 와야하는 자리라서 굳이 전화를 했단다. 갤러리 오프닝에서 남편이 양복 입은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란다.
“저도 초대하는 건가요?” 물었다. 나는 그런대로 옷이 있는 것 같은데 남편이 걱정이 되서 전화를 걸었단다. 우리는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응할 수 없는 자연스런 핑계가 생겨 마음이 가벼웠다.
얼마 전 한 오프닝에서 예전에 전화했던 그 멋진 여자가 손 백(clutch)을 우아하게 들고 있었다. 어디서 본듯한 눈에 익은 백이다. 집에 오기가 무섭게 집 안을 다 뒤져 그 백을 찾아냈다. 버릴까 말까 하며 처박아 두었던 것이다.
혹시나 해서 핸드백 회사 웹사이트로 들어가 보니 “아이고머니나.” 내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명품이다. 옆집 사람이 이사가며 버렸던 것을 주어 놓았었는데 이게 왠 횡재란 말인가.
브루클린의 우리 동네 그린포인트에서는 타 주에서 온 젊은 화가 지망생들이 아파트를 구하러 지도를 들고 이리저리 기웃 거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아파트를 구했는지 월말과 초에는 무빙 트럭에서 친구들과 짐을 옮기느라 부산들하다.
다른 한편에선 집 주인들이 집안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드리고 버린 빈 박스를 또는 버리고 간 물품들을 치우느라 바쁘기도 하지만. 연휴엔 부모들이 자식들이 사는 모양세를 보러 멀리서 방문하고는 스트릿 파킹을 신경쓰지 않아 티켓을 받고 당황해 하는 모습 또한 종종 보게된다.
그들과 눈이 마주치면 나는 왠지 내가 티켓을 준양 미안한 마음이 들어 “하이” 하곤 얼른 집안으로 쫓기듯 들어온다.
이렇게 시작한 화가의 길이 잘 풀리면 한동안은 짐을 쌀 필요가 없지만, 화가로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인가? 한쪽에서는 희망을 품고 이사를 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화가의 길을 접고 낙향을 하느라 많은 물건을 버리고 올 때와는 달리 소리없이 사라져간다.
우리 옆 건물은 무슨 사연이 그리도 많은지 수시로 젊은 사람들이 이사오고 나간다. 그들이 이사 나갈 때마다 나는 조그마한 횡재라도 한듯이 즐거워진다.
스트레처바(캔바스 틀), 가구, 옷 그리고 신발 등 친절하게도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박스에 넣어 길가에 내 놓거나 철제 울타리에 걸쳐놓기도 한다. 안목이 있는 화가들이 쓰던 물건이라 스타일도 좋다. 처녀 때 몸매를 그런대로 유지하는 나로서야 거의 작은 사이즈여서 잘 맞는다. 난 이런 날을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몇 번 입지 않은 새 옷들도 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명품들도 있다. 내가 기껏 아는 브랜드라고는 바나나 리퍼블릭과 제이시크루 정도인지라 혹시 해서 웹사이트로 찾다가 그 가격에 놀랄 때도 있다.
남편이 양복이 있냐며 조심스레 물었던 그 친절한 분에게 고백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해졌다.
'내 차림새는 이사가는 젊은 화가들 덕분에 생긴 옷이라구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