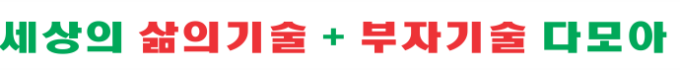눈물젖은 톱 연주 - 뉴욕중앙일보: 김미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46회 작성일 13-11-01 04:52
본문
(2013년 10월 26일 뉴욕 중앙일보 칼럼 - 전 노던벨리 고교 교사 김 미연)
남편 알렉스는 톱 연주를 즐겨한다.
최근 몇 년은 톱 연주가로 이름이 나서 뉴욕, 뉴저지의 각종 행사에 연주해달라는 초청이 심심치 않게 들어온다. 그가 톱을 연주한 세월이 어느덧 30여년이 지났고, 지금은 그래도 들어줄 만한 소리를 낸다. 사람들은 어쩌다가 그런 희한한 악기를 연주하게 되었냐고 질문을 할 때도 있다.
삼남 이녀의 막내인 알렉스가 초등학교를 시작할 무렵, 명동성당의 사목 회장님으로 성당 일만 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고무신 공장에 투자를 하여 전 재산을 날렸다. 다른 형제들은 사립학교도 다니고 등산, 미술, 피아노 등 사교육도 받았지만, 알렉스에게는 그런 혜택이 돌아오지 않았다.
알렉스가 바이얼린을 배우고 싶어하자, 할머니는 동네 친구 할머니에게 부탁을 해서 그녀 아들의 작은별 음악학원에 그냥 다니게 주선을 하셨다. 음악학원 원장 부부는 알렉스의 명동성당 주일학교 선생님이기도 하였으며 7명의 자녀를 음악가로 키우고 싶은 꿈을가진 분이셨다.
작은별 원장의 소개로 바이얼린 선생을 소개 받았지만 바이얼린도 없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는 꼬마에게 선생님은 나무막대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 막대기를 활 삼아 팔에 비비면서 '반짝 반짝 작은 별' 을 키며 깽깽깽깽 바이얼린 소리를 내라고 했다. 콧소리가 작다며 두 손가락으로 코를 잡고 비틀면 눈물이 날정도로 아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스는 선생님의 바이얼린을 훔쳐 보면서 한번 만져봤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바이얼린 선생님은 자신의 악기에 손도 못대게 하였다.

(백남준, 샤롯 무어맨, 존 케이지의 현악기를 위한 26.1 1499, 1965)
땟국물이 꼬질한 꼬마는 선생님의 냉대 속에서 깽깽 소리를 내면서 막대기로 열심히 연주를 하였다. 기막힌 전위 음악이 아닐 수 없다. 1965년 뉴욕에서 첼리스트 샤롯 무어맨이 애인 백남준의 몸에 활을 대고 첼로 연주를 하여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오히려 알렉스의 연주가 몇 년 앞서 있었던 셈이다. 그런 퍼포먼스를 며칠 동안 하다가 바이얼린을 사달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던 알렉스는 학원을 슬그머니 그만 두어 버렸다. 기운 가세 탓에 사태 파악이 빨랐던 막내는 '왜 학원 안가느냐'는 어른들의 질문에 '하기 싫어서' 라고 대답했다.
중학교 즈음인가? 하루는 학교 갔다 오니 대청마루에 찌그러진 고물 섹소폰이 놓여 있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 악기를 가지고 알렉스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즉각 익혔고, 라디오에서 들었던 뽕짝을 낮이나 밤이나 신나게 불어댔다. 이미자의 섬마을 선생님과 동백아가씨가 그의 단골 레파토리였다. 음이나 제대로 내었을까? 그의 이웃은 얼마나 시끄러웠을까? 아파트 간의 소음이 심각한 법정투쟁으로 까지 번지는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그래도 1960-70 년대 한국 사회는 참아 넘길 줄도 알고, 불평하기를 불편해하는 분위기였나 보다.
중학교 즈음인가? 하루는 학교 갔다 오니 대청마루에 찌그러진 고물 섹소폰이 놓여 있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 악기를 가지고 알렉스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즉각 익혔고, 라디오에서 들었던 뽕짝을 낮이나 밤이나 신나게 불어댔다. 이미자의 섬마을 선생님과 동백아가씨가 그의 단골 레파토리였다. 음이나 제대로 내었을까? 그의 이웃은 얼마나 시끄러웠을까? 아파트 간의 소음이 심각한 법정투쟁으로 까지 번지는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그래도 1960-70 년대 한국 사회는 참아 넘길 줄도 알고, 불평하기를 불편해하는 분위기였나 보다.

음악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미진함은 청년 알렉스로 하여금 군악대를 지원하게 하였다. 거기에 가면 음악을 제대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았다. 군악대 출신 원장이 하는 학원에 가서 행진곡 한 두개를 속성으로 배우고 나서 군악대 추천장을 써 달라고 부탁했다. 실력은 한참 미달이지만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지, 무슨 백을 썼는지, 하여튼 알렉스는 원장의 추천장을 받아냈다.
그런데 문제는 군대에 들어간 후에 발생했다. 기본 실력이 전혀 없는 엉터리가 군악대에 들어온 것이 발각이 되어 알렉스는 고참들에게 엄청 얻어 맞았다. 하지만 열정과 배짱이 있었던 그는 맞으면서도 나팔을 부는 법을 배웠고, 제대할 무렵에는 밴드매스터까지 했다고 한다.
미국에 유학을 온 후, 알렉스는 한국 방문 중 우연히 전봇대에 붙어있는 톱 교습이라는 광고지를 보았다.
미국에 유학을 온 후, 알렉스는 한국 방문 중 우연히 전봇대에 붙어있는 톱 교습이라는 광고지를 보았다.
최소한 한달은 배워야 한다는 톱선생의 말에 시간이 없으니 30 분 동안 만 레슨을 부탁했다. 선생은 미군 피엑스에서 힘들게 구한 미제 톱 이라면서 톱을 잡는 법, 구부리는 법 등을 가르쳐주었다. 알렉스는 미국에 돌아와 홈디포에서 10불 짜리 톱을 샀고, 틈틈히 거친 톱을 휘어 잡으며 쇠소리를 내었다. 음치인데다가 음악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는 나는 가끔씩 톱을 다리 사이에 끼고, 떨고, 누르고, 활로 비비는 남편을 '뭐 혼자서 아령이라도 하나?' 하는 식으로 무심히 보아왔다. 그는 열중하여 오래동안 움직이지 않았으므로 나는 별로 참견하지 않았다. 당시 결혼한 지 4-5년 되었지만, 중매로 결혼한 나는 그가 여전히 조금은 낯설었고, 이로 인해 자주 다투곤 했었다.
그런 어느날, 우리는 누군가의 권고로 성당에서 하는 메리지 엔카운터 피정을 참석하였다. 피정 후에는 배운 바의 실천을 위하여 참가 부부들과 매달 집에서 돌아가며 모였다. 우리는 당시 포트리 오래된 집 이층에 렌트를 살고 있었는데, 우리보다 십여년 위인 다른 부부들은 뉴저지 서버브로 들어가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다. 그 사람들 집에 가면 '나는 언제 이런 집에 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드디어 우리집에서 마지막으로 모일 차례가 되었다. 남편은 그들을 특별하게 대접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톱연주를 결심하였다.
우중충한 오래된 카펫 위에 둘러 앉아서 참가 부부들의 나눔이 끝나자, 남편은 마치 바이얼린이라도 들고 나오듯이 날이 뾰족한 톱을 들고 나왔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다. 나는 최대한 분위기를 잡고 톱연주를 들을 준비를 했다. 무슨 곡을 했는지 지금은 생각조차 나지 않지만, 하여튼 남편의 악기는 끽끽 거리면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나는 쇠가 진동이 너무 잘 되어 '이이잉 --' 할 때는 촉각이 곤두서고, 톱이 튀어서 '끼이익--' 할 때는 몸이 굳어져서, 사람들의 표정을 살필 용기조차 없었다. 그래서 열심히 경청만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정전이 되면서 불이 확 나갔다.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도 절대로 그만두면 안되는 일생일대의 연주를 하듯, 남편의 '이이잉 끼이익--' 연주는 계속 되었다. 사람들은 조금 더 듣고 있다가 한두 명이 간다고 일어섰다. 아마 일 이분도 안 되었을 듯 하지만 톱소리의 섬뜩함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손님들은 마침내 우르르 다 일어섰다. 그 깜깜한 데서 신발을 찾아 신겠다고 가파른 층계 위에서 일대 혼잡이 일어났다. 그제야 알렉스는 톱을 내려놓고 촛불을 밝히며 안녕히 가시라고 집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했다. 손님들이 앞을 다투어 떠난 후, 나는 남편에게 손님을 빨리 쫒는 참 희한한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 후에도 남편은 때때로 저녁 시간에 톱을 마주하고 오래 앉아 있었다. 어떤 때는 애간장 끓는 소리가 몇 시간도 계속되었다. 그 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마도 밖에서의 일이 여의치 않았을 때, 누군가에게 자존심이 심히 상했을 때, 톱을 꺼내 들지 않았나 싶다. 어둠 속에서의 고집스런 연주도 그래서 였을까?
그런 어느날, 우리는 누군가의 권고로 성당에서 하는 메리지 엔카운터 피정을 참석하였다. 피정 후에는 배운 바의 실천을 위하여 참가 부부들과 매달 집에서 돌아가며 모였다. 우리는 당시 포트리 오래된 집 이층에 렌트를 살고 있었는데, 우리보다 십여년 위인 다른 부부들은 뉴저지 서버브로 들어가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다. 그 사람들 집에 가면 '나는 언제 이런 집에 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드디어 우리집에서 마지막으로 모일 차례가 되었다. 남편은 그들을 특별하게 대접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톱연주를 결심하였다.
우중충한 오래된 카펫 위에 둘러 앉아서 참가 부부들의 나눔이 끝나자, 남편은 마치 바이얼린이라도 들고 나오듯이 날이 뾰족한 톱을 들고 나왔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다. 나는 최대한 분위기를 잡고 톱연주를 들을 준비를 했다. 무슨 곡을 했는지 지금은 생각조차 나지 않지만, 하여튼 남편의 악기는 끽끽 거리면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나는 쇠가 진동이 너무 잘 되어 '이이잉 --' 할 때는 촉각이 곤두서고, 톱이 튀어서 '끼이익--' 할 때는 몸이 굳어져서, 사람들의 표정을 살필 용기조차 없었다. 그래서 열심히 경청만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정전이 되면서 불이 확 나갔다.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도 절대로 그만두면 안되는 일생일대의 연주를 하듯, 남편의 '이이잉 끼이익--' 연주는 계속 되었다. 사람들은 조금 더 듣고 있다가 한두 명이 간다고 일어섰다. 아마 일 이분도 안 되었을 듯 하지만 톱소리의 섬뜩함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손님들은 마침내 우르르 다 일어섰다. 그 깜깜한 데서 신발을 찾아 신겠다고 가파른 층계 위에서 일대 혼잡이 일어났다. 그제야 알렉스는 톱을 내려놓고 촛불을 밝히며 안녕히 가시라고 집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했다. 손님들이 앞을 다투어 떠난 후, 나는 남편에게 손님을 빨리 쫒는 참 희한한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 후에도 남편은 때때로 저녁 시간에 톱을 마주하고 오래 앉아 있었다. 어떤 때는 애간장 끓는 소리가 몇 시간도 계속되었다. 그 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마도 밖에서의 일이 여의치 않았을 때, 누군가에게 자존심이 심히 상했을 때, 톱을 꺼내 들지 않았나 싶다. 어둠 속에서의 고집스런 연주도 그래서 였을까?

(뉴욕 코리안 페스티벌 맨하탄 32가 야외무대공연)
그런 세월이 30여년 흐르고 나니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톱 연주를 해달라는 요청이 교회에서 들어오고, 각종 이벤트에 초청되어 가기도 한다. 할머니들은 심금을 울린다며 알렉스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신다. 이제 알렉스는 뉴욕 퀸즈 아스토리아에서 매년 열리는 국제 톱 페스티발에 참가하여 박수를 많이 받는 톱연주가(Musical Sawist)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
남편은 바이얼린이 없어 못 이룬 현악기에 대한 꿈을 성년이 되어 홈디포에서 산 10 불 짜리 톱으로 그렇게 이루어 가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