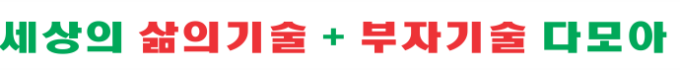마스크 만드는 남자 - 뉴욕중앙일보: 김미연
페이지 정보
작성자 Angel 댓글 0건 조회 164회 작성일 21-05-30 22:41
본문
들들들... 들들들... 소리가 온 종일 계속된다. 쌓아둔 헌 옷이 후줄근한 가리개로 다시 태어난다. 작년 초 팬더믹이 닥치자, C 씨는 마스크를 만들기 시작했다. 마스크가 품절이라서 그의 아내도 하고 다녔다. 뉴스를 보지 않던 아내가 TV 앞에 쪼그리고 앉는다. 텐트를 친 임시 병동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고 구호 물품을 받으려는 줄은 끝이 없다. 아내는 눈앞이 까매지고 어지러워 주저앉는다. C 씨는 방에 박혀서 재봉틀에 몰입했다. 필터가 있어야 하고, 감이 쫀쫀해야 하고, 마스크 규정이 나왔다. 누구에게 줄 수도 없는 엉성한 마스크를 왜 자꾸만 만드냐고 아내는 인상을 쓴다. 사람이 차단된 세상에서 단 한 명 남은 사람을 피하여 부부는 각자의 세계로 들어간다.
한국 여자 치고 억척의 강을 건너온 어머니와 할머니를 두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압록강 물살에 저항하며 칠흑의 삼팔선을 건넜다는 소녀적 어머니, 피난길 역전에서 떡을 만들어 딸들에게 팔아 오라고 했던 할머니다. 쌀밥이 그리운 소녀는 무용단을 모집하는 군대의 포스터를 보고 입대했고, 사흘 후 변두리 텐트에서 잡혀서 집으로 끌려왔다. 겨울밤에 아이들을 아랫목에 앉히고, 너희는 좋은 시절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던 어머니의 눈이 아득했다. 70년 전 이야기가 다시 돌아올 줄이야. 아내는 꿈이 활개를 치는 잠자는 시간이 차라리 편하다. 밤하늘을 날아다니는 샤갈 그림의 여자처럼 초현실로 가고 싶다.
집의 공간은 차츰 땅따먹기가 되었다. C 씨는 아내가 차지한 거실과 부엌을 기웃거리지 않는다. 먹거리는 시간과 손잡고 또박또박 사라진다. 오래 두어도 견디는 것들로 장바구니를 채운다. 아내는 기분에 따라서 밥 먹으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했다. 딸그락 소리로 식사 시간을 가늠해야 했다. C 씨는 지하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고장 난 것, 싫증 난 것, 여행지에서 산 것, 매일 쓰레기가 산만큼 나갔다. 창고였던 공간에 자신만의 가게를 차렸다. 눈곱만큼이라도 노스탤지어가 있는 것은 남겨 두었다. 군악대 사진, 초등학교 졸업장, 진분홍 한복 옆의 호위무사 같은 부부 사진. C 씨는 어릴 적 어머니를 도와 구멍가게를 한 적이 있다. 물건 정리와 연탄 배달은 소년 시절부터 터득한 솜씨다. 그에겐 모든 물건이 귀했다.
"이건 정말 명품 같지 않아? 로고만 있으면 샤넬 마스크야!” C 씨의 손에는 컵케이크, 피망, 개구리가 웃고 있는 각종 마스크가 들려있다. 화려한 겉감에 카모플라쥬 안감도 댔고, 길이 조정이 가능한 파스텔 톤의 고무줄도 달려있다. 이번에는 재활용이 아니다. 아내의 눈이 번쩍 뜨인다. 예쁜 것을 까마득히 잊고 산 일 년이다. 들어가지 않던 재봉 방을 아내는 슬쩍 들어가 본다. 전기 히터를 켜놓고 C 씨는 등을 구부린 채 집중하고 있다. 발은 바퀴를 돌리고, 손은 헝겊을 민다. 핸드폰에서 퍼지는 트로트가 흥을 돋운다.
"초오근 목피~~ 그 세월을 어어찌 사셨소 오오~~"
아내는 처음에는 마스크 두엇만 달라더니 스무개, 서른개로 점점 늘려갔다. 무서운 균이 세상을 장악하니, 사소한 감정들은 다 물러갔다. 마음은 정화 작업을 하나 보다. 연락이 끊어진 사람들이 생각나고 그들의 안부가 궁금해진다. 마스크를 보낸 후에 아내의 마음은 우체국으로, 길로, 따라다니고 있었다. 우표가 모자라지나 않을까 염려한다. 일단 내 손을 떠난 것은 맡기라는 남편의 말이 징처럼 아내의 가슴에 울려 퍼진다.
길고 깊은 밤은 지났다. 12월 동지부터 빛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일월 해는 조금씩 길어지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