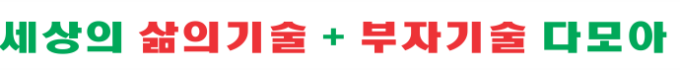포트리 김씨네
페이지 정보
작성자 Angel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4-05-13 02:43
본문
나는 한 벽을 차지한 가계도에 눈이 끌린다. 얼마 전 아들이 페밀리 트리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이다. 아들에게
보여주려고 사진부터 두어 장 찍었다. 미술관 벽에 그려진 족보는 중세의 피렌체 마을에서 시작된다. 맨 위에 있는 고조 할아버지가 약장수를 했다. 약장수였기에 메디치라는
이름이 생긴 모양이다. 당시에 키우던 약용 오렌지가 가문의 문장에 보인다. 3, 4대쯤 가서는 인물이 나온다. 정식부인이 낳은 큰아들은 대를
이을 정치가로 키우고, 밖에서 낳아 온 아들은 신에게 바쳐서 교황을 만들었다. 프랑스로 시집가서 여왕이 된 딸도 나온다. 먹고살 만한 정도를 넘어서
가문이 번창하니, 후손들이 정체성을 찾는 것은 당연했다. 최고의
화가를 메디치궁전에 불러 들여서, 초상화 작업에 들어갔다.
미술관은 예약제라서 그런지 사람이 많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도 두 사람만 허용했다. 로마 황제를 닮은 듯한 메디치
선조의 두상이 놓인 입구를 지나서, 전시방으로 들어갔다. 특별전
제목이 ‘초상화와 정치’(Portraits and Politics)다. 반짝이는 초록 커튼 앞에, 주름이 차르르한 옷을 입은 젊은 남자의
길고 유연한 손에는 당대 인기시인 페트라르카의 시집이 들려 있다. 옷을 반쯤 걸친 그리스 신을 닮은
사람 뒤로 파르나수스산이 보인다. 얼룩 달룩한 모자를 쓴 단테가 불타는 강가에서 책을 보는 그림도 있다. 황제나 신의 반열에 오른 듯 하게 표현된 메디치가 초상화는 그들에게 자부심을 주었을 것이다. 미술관 정문의 물결치는 층층계를 내려오니 서늘한 가을바람이 분다. 핸드폰에
담은 메디치가 족보 사진이 있어서, 뭐라도 건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얼마 전 부터 아들이 친척 모임에 오는 사람들의 관계를 캐기 시작했다. 삼십 년 전에 사촌 서너 집이 모이기 시작했다. 해가 거듭될수록, 친가, 외가 구별 없이 육촌, 팔촌, 실날같은 연관이라도 있으면 다 모였다. 부모를 따라서 모인 아이들은 ‘우리가 다 친척이래’ ‘어떻게 친척인데?’ 서로 얼굴을 쳐다보다가는, ‘Oh, Whatever, We are all
cousin!' 하며 헤아리기를 그만두었다. 그런데 세대가 바뀌자 상황이 좀 달라졌다. 부모가 된 아이들이 자신들의 촌수도 자세히 모른 채 ‘커즌' 한마디로 얼버무리기는 좀 그랬던 모양이다. 고만고만한 자기아이들
끼리의 관계를 알고 싶어했다.
아들이 종이와 펜을 들고 와서 묻는다. “제임스와
나는 어떻게 친척이야? 에리카는?”
먼지만 뒤집어쓰던 남편의 족보가 등장했다.
“조선
말에 한 어른이 살았다. 그분이 아들 넷을 두었다. 첫째
아들은 한약방을 해서 돈을 많이 버셨다. 그분이 네 할아버지의 아버지,
증조부시다.”
“그럼
제임스네는? 내 할아버지만 자랑하면 안 되잖아.”
“제임스
증조부는 둘째 아들이다. 전문학교를 나와서, 동네 행정일을
하셨지."
조선의 옛 이야기가 미국 뉴저지에서 재현되고 있다. 파뭍혔던 책이 처음으로 포트리의 공기 속에서 거풍을 한다. 메디치네처럼
근사한 초상화는 없지만, 바랜 족보라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