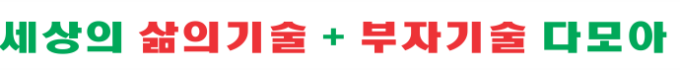러시아의 카페 - 뉴욕문학: 김미연
페이지 정보
작성자 Angel 댓글 0건 조회 187회 작성일 21-05-30 22:55
본문
오늘은 가이드를 따라 나가지 않았다. 버스 타고 두 세시간 가야 할 피터호프 궁전이 별로 궁금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며칠 붙어 다녔더니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싶었다. 유럽의 장인을 불러다 지었다고 하니 비슷비슷할 것이고, 여기저기 발라 놓은 황금색 페인트 밑에 문화적 열등감을 숨겨놓은 캐서린 여왕의 여름 궁전을 이미 보고 난 후였다. 유럽에서 제일 늦게까지 왕조가 있었고 한 시절 지성인이라면 앞을 다투어 열광했던 공산주의 나라, 한때 갈 수 없었던 나라였기에 이다지도 사람들이 몰리는가?
오늘은 글을 쓰겠다고 마음먹는다. 남편과 친구 부부를 로비에서 떠나보내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호텔 카페로 들어온다. 프롤레타리아의 나라답게 절제스럽고 고즈넉한 분위기다. 여행에서 돌아가면 글을 보내야 한다. 로컬 신문에 보낼 북리뷰 마감일이 임박했다. 여행 중에 글이 떠오르려니 했는데 손이 멈추니 진전이 전혀 없었다. 생각만 가지고는 형태가 잡히지 않는 모양이다. 친구는 여행 와서 웬 글을 쓰냐고, 섭섭한 표정을 짓는다.
그간 남편과 둘이서 여행을 다녔다. 남편은 어느 도시건 두 발로 일단 섭렵해야 했다. 미리 공부했다지만 자기도 처음 오는 곳이니 헤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한다. 동경에서는 미로 같은 지하철 노선을 못 찾아서 역 안을 뺑뺑 돌았고, 베를린에서는 버스를 타지 못해 광활하고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무진장 걸었다. 인상 쓰는 내 눈치 보랴, 길 찾으랴, 남편은 석상마냥 굳어지고, 더운 날씨가 무색하게 분위기는 꽁꽁 얼어붙는다. 목적지에 도착하지만, 이미 지쳐버린 나는 두리번거리며 카페부터 찾는다. 안 본다고 혼자 가라고 하면 남편은 보기에도 부담스런 구닥다리 카메라, 내심 고급이라고 뿌듯해하는, 니콘 300을 어깨에 둘러메고 훌쩍 가버린다. 저놈의 카메라, 저것 때문에 가는 족족 얼마나 많은 미술관에서 경계의 시선을 받았는지. 이번 여름, 둘만의 여행을 피하고자 친구 부부와 함께 여행사의 그룹 패키지에 조인했다.
모스크바의 푸시킨 카페에서 저녁을 먹은 후 디저트를 하기 위해 가까운 티 룸을 들어갔다. 로코코 풍의 화려한 커튼밑에 촛불이 은은하다. 금박 아이보리 꽃병으로 장식된 실내는 마치 궁전의 한 코너인 듯하다. 뉴욕 출발부터 같이 있었더니, 대화도 동났고 할 말도 없는 나는 북리뷰를 쓰고 있는 파칭코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평소 남편에게 중얼거리다 생각지도 못한 그럴싸한 말이 불쑥 튀어나와서 글의 실마리를 찾는 적이 있기 때문이다. 장황하게 말하는 것을 친구 부부가 어떻게 여길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핍박받는 재일교포의 이야기, 한 여름 밤의 백야를 찾아온 여행객의 입에서 나올 주제는 아니지만, 생각을 정리하고 싶은 유혹이 무엇보다 강렬했다. 친구 부부는 책 제목은 들었는데 읽어보지는 않았다고 하고, 남편도 그 정도로 비참한 실상은 잘 모르는 눈치다. 해방 후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을 조총련으로 보는 시각이 만연했었고, 냉전 시대의 남한은 성분이 빨간 자들의 이야기는 금기였기에, 나도 책을 읽기 전에는 잘 몰랐다.
호텔 카페는 이제 아무도 없다. 그나마 아침에는 커피를 마시는 관광객이 한 둘 있었다. 볼가강이 흐르는 작은 동네, 건너편 석조 건물의 당당한 격자 창문들, 지나가는 사람도 눈에 띄지 않는다. 저만치 늘씬한 웨이트레스 한 명이 홀에 있다. 커피 리필을 부탁하고 다시 아이패드를 두드린다.
거대한 크레믈린 컴플렉스의 레드 스퀘어에 서 있다.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바질 성당을 배경으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광장에서 머리카락이 흩날린다. "너는 30대의 오노 요꼬를 생각나게 해." 갑자기 누군가 말을 건다. 캘리포니아에서 온 다이애나 할머니다. 오노 요꼬라니. 존 레넌과의 신혼의 밤을 사진으로 공개하고, 관객을 무대로 초대해서 작가의 옷을 가위질시켰던 자신감 넘치는 전위 예술가 아니던가. 날아갈 듯 말 듯 한 커다란 나비 장식이 있는 나의 카키 코트 탓인가? 기분이 갑자기 청량해진다. 같이 서 있던 친구도 그 말을 들었다. 말도 없고 표정도 없는 친구에게 눈치가 살짝 보였다.
여왕의 컬렉션으로 유명한 허미타쥐 박물관에 왔다. 기나긴 줄에서 밀고 당기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손바닥만 한 오리지널 앞에 당도했다. 가이드는 사진 촬영 포인트까지 알려준다. 친구는 온 러시아를 카메라에 담아 갈 듯 열정이 대단하다. 사진을 잘 찍는 그녀는 요령이 필요하다고 가르쳐 준다. 대상의 발에 초점을 맞추고 사진기 각도를 앞으로 살짝 기울이면 사람이 늘씬해 보인다며, 자기가 잘 찍어서 내 사진이 잘 나온다고 덧붙인다. 가르쳐 준 대로 그녀를 예쁘게 찍으려고 애쓰지만, 나의 동작은 엉성하기 그지없다. 카메라를 들고 이리저리 흔들다가 지쳐버렸다. 이런 것은 조작이 아닐까. 옷 사러 가서 거울을 보면 다 이쁜데, 집에 와서 보면 전혀 아니다. 거울을 경사지게 걸었든지, 조명등이 위에 달렸든지. 무엇이 숨어있기 마련이다.
어느덧 파칭코 초안을 거의 다 썼다. 손이 저절로 쓰는 것은 아닐지라도, 손목에 밀대라도 달린 듯 진도가 잘 나간다. 허기를 느낀 나는 점심을 주문한다. 허브를 얹어 노릇하게 구운 고등어와 비트 양배추 코올슬로우는 그간 가이드를 따라다니며 먹은 어느 음식보다 맛있다. 카페에 혼자 앉아있는 것이 그렇게 싫더니, 오늘은 이렇게 좋을 수가. 내 일생에 언제 다시 생피터스버그에 와서 글을 쓰려나. 꽃 수가 놓인 앞치마를 매고 서늘한 눈매를 한 러시안 웨이트리스가 커피 팥을 들고 다가온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