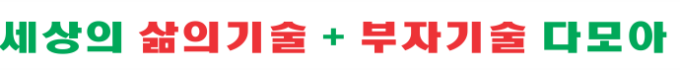고독을 씹는 무말랭이 - 뉴욕중앙일보: 김미연
페이지 정보
작성자 Angel 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1-05-30 22:40
본문
"아, 이게 웬일?"
시커먼 점점이가 쫙 퍼져 있다. 짐승의 공격은 분명 아닌데, 무슨 역병이 돌았나? 공들여 한 칼질이 허공으로 사라질 판이다. 여름에 오이와 케일을 빼앗겼을 때는 괘씸하더니, 이번에는 정체를 몰라서 황당했다. 밤에는 내 집이 내 집이 아니다. 무단 침입한 게릴라들의 세상이 된다. 사슴, 너구리, 토끼, 오소리 등등 다국적 '챨리'들이 종횡무진 다닌다. 이들에 대한 보복 심리가 깔려 있어서, 이번에는 말랭이들을 꼭 지키려고 했다.
피난 갔다 오니 장에 박아 놓은 무가 말랭이가 되어 맛있게 먹었다는 육이오 시절 이야기가 생각났다. 단물이 도는 늦가을 무를 손가락 크기로 썰었다. 시뻘건 다라이에 한가득 넣었다. 햇볕 아래 두면 선샤인비타민이 나온다고 하지 않는가.
해 질 무렵 말랭이를 들여놓으러 나갔다. 그런데 하얀 몸체에 시커먼 점들이 마구 있었다. 이를 어째, 다 버려야 할 판이다. 백주 대낮에 아무리 간 큰 챨리라도 덱까지 올라 올 리는 없다. 눈을 부릅뜨고 보니, 흰 몸 그대로 끄떡없는 애들도 있었다. 아, 촘촘히 살을 맞대고 있는 말랭이들이 문제였다. 서로 손잡고 팔짱 낀 곳에 시커먼 반점이 생겼다. 서로 자기 몸의 물을 마구 뿜어댄 것이다.
태곳적에 한 꼬물거리는 생명체가 있었다. 어느 날 옆에서 꼬물거리는 다른 생명체를 감지했다. 저것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치고 들어온다. 궁리하며 꼬리를 돌려서 다른 생명체에게 다가갔다. 뇌는 이런 출생의 비밀을 가졌다고 한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누가 나를 거스르면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그래서 똑같은 말을 쏘아 주던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하소연이라도 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 것도 같다. 그런 행동을 하고 나면, 스스로의 얄팍함에 회의하지만, 알고 보니 뇌는 그렇게 생겨 먹었다고 한다. 더 이상 나의 타고난 운명에 대해 고민하지 않기로 했다. 단지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자성을 늦게라도 하면 된다. 하룻밤을 혼자 생각하면서 또 다른 나를 불러오면 된다.
말랭이들은 고독해야 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무엇이 넘쳐날 때는 그래야 했다. 하룻밤만 지나면, 부글거림은 증발하고 꾸덕꾸덕해 진다. 태양 아래서 살겠다고 옆의 친구에게 감정을 마구 뿜어냈지만, 살기 위한 증발은 혼자서 해야 했다. 혼자서 숨을 골라야 했는데 바짝 붙어 있다가 일을 당했다. 다라이 귀퉁이에 떨어진 나 홀로 말랭이들은 자신의 모습을 건사했다. 온전한 말랭이들을 거리를 두고 흩어 놓았다.
"혼자 있어,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썰렁한 할리데이를 보내야 하는 12월이다. 친구의 등을 치면서 웃고 싶고, 새로 사입고 나온 옷도 만져보며 이쁘다고 말하고 싶다. 커피와 샌드위치를 나누던 시간이 그립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단물의 유혹에 넘어갔다가는 말랭이 운명이 될 지도 모른다. 이번 겨울을 잘 넘겨야 한다고, 살아 있으면 만난다고, 친구들과 카톡을 나눈다. 무말랭이처럼 떨어져 있어야 하는 시간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