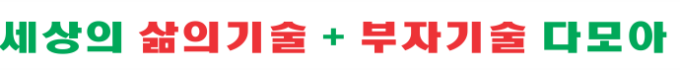페퍼 스프레이 - 뉴욕중앙일보: 김미연
페이지 정보
작성자 Angel 댓글 0건 조회 188회 작성일 21-05-30 22:52
본문
"엄마, 맨해튼에 나가기로 했어요?" 아들이 묻는다.
"가기로 했어." 아들은 대꾸가 없다. 별로
마땅치 않은 모양이다. 다음 날 아들은 페퍼 스프레이를 가지고 왔다. 손가락
굵기의 가벼운 플라스틱이다. 같이 가기로 한 친구는 식구들이 반대해서 못 간다는 답이 왔다.
일 년 반 만에 맨해튼에 나갔다. 친구들을
프릭 미술관에서 만나기로 했다. 옛날 위트니 미술관이 몇 년 전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부속 갤러리가
되었다. 이번에 팬더믹을 지나면서, 그 자리에 프릭 미술관이
새로 들어왔다. 4층의 현대식 건물에 고졸한 그림이 걸려 있고,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나는 그림은 뒷전이고 친구들의 머리를 찾기에 바쁘다.
"어머 가숙 씨..."
"어머 봉자 씨..."
서로 어깨며 팔을 만진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다. 말보다 강력한 느낌이란 것이 사람 사이에 흐른다는 것을, 일 년 남짓 사이에
잊어버렸다.
줌을 할 때는 몰랐다. 말이 잘
들렸고, 편안했고, 집중도 잘 되었다. 대면 시기가 되어도 줌이 좋다는 친구도 나타났다. 접속 신호가 뜨면, 우선 내 얼굴이 스크린에 나타난다. 빨강색 내 머리가 일단 눈에
거슬려서 어떻게 치울 수도 없는 머리를 한번 슬쩍 만져본다. 친구도 부스스한 자신의 머리를 만지작 거린다. 어떤 친구는 멀찌감치 앉아서 얼굴이 잘 안 보인다. 흐릿한 윤곽들, 알 수 없는 표정의 이미지들이 나타났다가 그렇게 사라지곤 했다.
갤러리 사람들 사이로 또 한 친구가 나타났다.
"왜 이렇게 말랐어?" "그간 일이 많았어." 아, 팬더믹이라고 집에 숨어 있다고, 크고 작은 일상사들이 우리를 못 찾아낸 것은 아니었지, 가슴이 짠
해온다. 또 한 친구는 나를 알아보지도 못한다. 나를 아래위로
훑어 보더니 "어머 어머" 만 반복한다. 아무리 마스크로 가렸다고 해도, 십 년을 봐 온 친구인데 몰라보더니. "아니 머리 스타일이 확 달라져서, 전혀 다른 사람 같아." 팬더믹 동안에 해나 염색을 집에서 한 탓에 나는 완전 빨간 머리가 되었다. 나 편하면 제일이라는 뻔뻔함이 외출을 잃어버린 동안에 자리를 잡았나 보다.
"뭐 아시안 같지 않아서 얻어맞을 염려는 없겠네." 한 친구가 덧붙인다. 우리는 같이 웃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림을 보고
싶어서, 문화를 따라가고 싶어서, 미술관을 다닌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친구가
"어머, 미연 씨"라고, 내 이름 석 자만을 말했는데도, 무엇이 내 몸을 뚫고 들어왔다. 모래처럼 까끌하던 마음이 찰떡처럼 끈적거린다. 컴퓨터의 줌도, 대가의 그림도 뚫지 못하는 감정, 그 감정이 나와 친구를 까배기처럼
엮어 준다.
미술관의 실외 정원은 드문드문 앉은 테이블로 고즈넉하다. 립스틱을 바르지 않은 얼굴 윤곽선이 드러낸다, 아 맞아, 저 얼굴 들이지. 줌을 할 때는 그립다는 느낌은 없었다. 그런데 얼굴을 보니, 왜 그리운 감정이 솟구치는지. 아메리카노와 크루아상과 더불어 수다 삼매경에 빠지는데, 페퍼 스프레이가
나의 옆구리를 찌른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빨리 꺼내려고
주머니에 넣었던 것이다. 나는 스프레이를 꺼내서 슬그머니 백으로 옮긴다. 오늘은 쓸 일이 없을 듯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