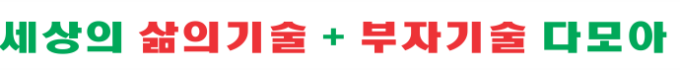생트마리의 아침 - 뉴욕중앙일보: 김미연
페이지 정보
작성자 Angel 댓글 0건 조회 148회 작성일 21-05-30 22:38
본문
창으로 빛의 조짐이 보인다. 태양은 어느 곳이나 비슷한가. 차분한 기대감을 주는 새벽 시간, 가파른 층계를 내려온다. 뚜껑을 열어본다. 열 몇 시간 숨을 자유자재로 내뿜어 그것은 구멍이 송송하다. 밤사이 고독에 순해지다 못해 제 멋대로 늘어진 형체를 꺼내어 접고 두들겨서 모양을 만든다. 다시 용기에 넣어서 뜨근한 담뇨로 겹겹이 싸준다. 한 번 더 부풀면서 내적으로 단단해지는 시간이다.
그것은 열병을 앓고 나더니 핸섬해졌다. 길쭉한 원통 모양을 세 등분하여 실로 묶는다. 달군 무쇠 솥에 눕혀서 오븐 안에 넣는다. 구수한 냄새가 솔솔 퍼지면 다 되었다는 신호다. 실로 묶은 부분은 잘록하니 호리병이 옆으로 누운 모습이다. 한 김을 식힌다. 따끈한 그것은 버터와 같이 놓이는데, 밖은 탕탕 소리를 낼 정도로 바싹하고, 안은 부드럽고 찰지다.
이거면 된다. 잘 자고 나서 말짱한 아침이면 행복하다. 작은 산마을, 무스티에 생트마리에 왔다. 돌층계가 빼곡한 구불진 골목을 내려오면 평평한 저잣거리, 외지인이 오지 않는 오지, 선대서 하던 빵집을 물려받은 뚱뚱한 영감님은 물과 소금과 이스트로 반죽한 중세 빵을 구워놓고 손님을 기다린다. 나는 다소 냉냉한 아침 공기에 플리스 재킷을 입고 앉아 있다. 서늘함에 고개를 휘젓는데, 방금 갈아서 짙은 아로마를 풍기는 커피를 아줌마가 내오고 있다. 거기다가 과일 스무디 맛이란. 주황색과 보라색 한 줌, 농장에서 직송했다는 파란 껍질을 가진 흰색 반쪽, 물과 섞여서 액상화된 그들의 맛이란. 이잉하고 돌아가는 둔탁한 믹서 역시 고물이지만, 원심력과 구심력은 아집을 갈아주고야 만다. 땅이 모자라 켜켜 붙은 집들은 하늘과 친하고자 삐죽해서 아찔한 희열을 준다. 중세부터 견뎌온 돌집이 그렇듯이 희뿌연 불그레한 모자를 이고 있다. 낮에는 나선길을 따라 절벽에 서서 베르동 협곡을 본다. 수도사들이 살기 시작했다는 이 마을은 그림같이 아름다운데 그림 속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아.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아니, 보는 것이 더 행복해.
투어가 큰 화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리도 안 아프잖아, 중세 빵과 금방 간 마얀 커피와 스무디는 내 부엌에서 현실이 되고, 눈은 프랑스 남부 어디쯤 가 있다. 티브이는 그 새 프로방스를 끝나고 파리의 아트 페어로 넘어갔다. 유리 천장으로 채광이 환히 들어오는 기차역이 근처에 있을 것이다. 떠나고 싶은 열망이 빵 반죽처럼 부푼 아침에 나자르 역에서 남쪽으로 가는 기차를 갈아 탄다. 나는 2020년 가을을 여행 중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